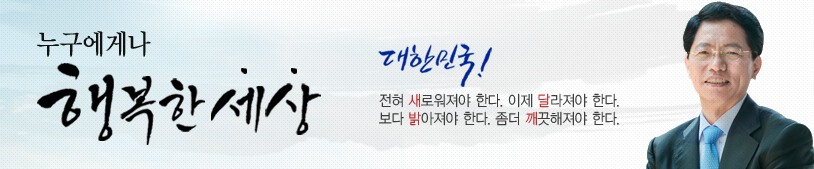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망자의 한을 달래며
삶과 죽음을 다루는 직업
성직자와 의사와 법관의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사람의 삶과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 일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성스러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성직자는 삶의 고통을 함께 젊어지고 아린 가슴을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망자(亡者)의 혼을 주관하는 위로자이다.
의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고독한 투사이다.
법관은 직업의 속성이 그렇듯이 대개 지나간 과거사(過去事) 속으로 소급(遡及)해 들어가 그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분석해내는 데 골몰하는, 마치 역사가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
실제 재판은 지나간 삶의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증거자료라는 사료(史料)를 통하여 사실과 진실을 찾아가며 추론한다는 점에서 역사가의 역할과 비슷하다.
나중에 상세히 보게 되는데,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은 우리에게 역사이지만, 법관은 거창사건을 다루는 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하여 사관(史官)이 된 심정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법관은 이미 죽은 사람의 값을 재량(載量)하는 일도 하여야 한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면 그 생명의 가치도 같아야 하건만, 인간이 만든 재판제도 아래에서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목숨의 값도 제각각이다.
법관은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과 그 유족의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고, 무슨 동기에서건 사람을 죽인 피고인의 형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양형(量刑)하여야 한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피고인의 목숨을 빼앗는 극형을 주는 악역(?)도 때로는 맡아야 한다.
돌아가신 분께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법관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골치 아픈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갑자기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호적등본이 제출되면 깨끗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 하나를 처리하기도 한다.
성직자와 의사와 법관의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사람의 삶과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 일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성스러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성직자는 삶의 고통을 함께 젊어지고 아린 가슴을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망자(亡者)의 혼을 주관하는 위로자이다.
의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고독한 투사이다.
법관은 직업의 속성이 그렇듯이 대개 지나간 과거사(過去事) 속으로 소급(遡及)해 들어가 그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분석해내는 데 골몰하는, 마치 역사가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
실제 재판은 지나간 삶의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증거자료라는 사료(史料)를 통하여 사실과 진실을 찾아가며 추론한다는 점에서 역사가의 역할과 비슷하다.
나중에 상세히 보게 되는데,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은 우리에게 역사이지만, 법관은 거창사건을 다루는 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하여 사관(史官)이 된 심정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법관은 이미 죽은 사람의 값을 재량(載量)하는 일도 하여야 한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면 그 생명의 가치도 같아야 하건만, 인간이 만든 재판제도 아래에서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목숨의 값도 제각각이다.
법관은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과 그 유족의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고, 무슨 동기에서건 사람을 죽인 피고인의 형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양형(量刑)하여야 한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피고인의 목숨을 빼앗는 극형을 주는 악역(?)도 때로는 맡아야 한다.
돌아가신 분께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법관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골치 아픈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갑자기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호적등본이 제출되면 깨끗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 하나를 처리하기도 한다.





